프랑스 일주 여행을 다녀온 뒤 여정을 되짚어가며 블로그에 여행기를 써서 올렸다.
그때는 바둑의 복기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는데 새로 여행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다. 왜냐하면 지명이나 사진 찍은 대상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굳이 노년의 (短期)기억의 휘발성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번처럼 짧은 기간에 많은 곳을 다녀온 경우에는 기록으로 남겨놓을 필요가 있었다.
불과 1~2주일 전에 다녀온 것이지만 찍은 순서대로 사진을 늘어놓고 기억을 더듬어 쓰는 일도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건물 이름이, 특히 이번 여행 중에 유독 많았던 그림이나 조각상의 이름이 생각나지 않아 스마트폰 앱인 구글렌즈의 도움을 받아 확인하곤 했다.
그래도 좋았다. 여행을 새로 하는 기분이었으니까.
여행기에 올리지 못한 사연이 있다고?
프랑스 여행 경험이 없거나 아주 오래 전에 다녀온 독자들을 위한 가이드 북 역할에 보다 충실하기 위해 여행기에서 빼놓은 사연과 사진들이 적지 않았다. 이를테면 이번 패키지 여행 중에 겪었던 아주 주관적인 경험담 및 상식적인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
첫째로 그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에 속하는 사항으로 일부 사진이나 사연은 소개하지 못했으나 아주 흥미로운 일도 적지 않았다.
둘째로 이번 여행지 또는 여행일정과 관련하여 연상되는 사람과 사건에 대한 것이다.
끝으로 다음 여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사항도 빼놓아선 안 되지만 온라인 백과사전을 비롯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는 지면관계상 생략하였다. 예컨대 나폴레옹, 그의 이름을 딴 법전과 도량형, 프랑스 대혁명과 이집트 정벌,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명품 숍 그리고 수많은 예술가들에 대해서는 굳이 여기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그리고 주지의 사실이지만 요즘 패키지 투어에서는 자기소개의 시간이 없다. 단 며칠 동안만 함께 여행을 하는 사이(accidental tourist)이므로 굳이 자신을 밝힐 필요 없이 익명성(anonymity)을 누리면서 여행을 하는 것으로 족하다.
그러니 처음 며칠 간은 식당에서 합석을 해야 할 때, 버스 여행 도중 휴게소에서 쉬고 있을 때 눈치껏 탐색전을 벌여야 한다. 처음부터 나는 어디 사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이가 없기 때문이다. 내 경우 혼자 여행을 하였기에 부인은 어찌하고 혼자 다니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았다.
이 과정에서 사람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의 직업이나 관심사, 여행의 동기 등을 추리 내지 추측해보는 일이 많았다.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한 후 그 결과물을 보면서도 그의 솜씨 이전에 직업과 성격을 추론해 보기도 했다. 심지어는 커플이 여행하는 경우 부부 사이의 친밀도를 헤아려보는 일도 있었다. 부부의 사진을 찍어줄 때 서로 포즈를 취하는 모습에서 그러한 관계가 엿보이곤 했다.
나의 경우 초반에 신분이 들통이 나버렸다. 내가 혼자 프랑스 여행을 떠난 것은 30여년 전의 트라우마 때문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거니와 다년 간의 해외거주 경험이나 강단에 섰던 경력이 말투에 그대로 드러난 탓이었다. 내가 대화 중에 말하는 내용이 상식 수준이 아니고 체험을 바탕으로 상당히 깊이가 있고 체계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의 직업을 추리해 보면서 사람이 몇 십 년 간 종사했던 일이 그의 퍼스낼리티를 좌우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특히 공직 또는 교사 생활을 오래 한 분들이나 비즈니스를 해온 분들은 확연히 표가 났다.
그리고 나의 경우 인솔자가 버스 안에서 틀어준 DVD 영화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마이크를 달라고 요구했던 것처럼 마이크를 쓰기 좋아하는 사람도 확실히 구분이 되었다. 이를테면 교수, 목사, 정치인 같은 직업인은 달라도 뭔가 달랐다.[1]

여행이 중반에 접어들면서 대화를 나누었던 일행에 대해서는 한두 사람 건너면 서로를 잘 아는 사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라기도 했다.[2]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많이 하는 사람은 더욱 그러했다. 현재의 정설은 6단계만 거치면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거지만, 한국은 혈연, 지연, 학연으로 얽혀 있는 사회이므로 그 단계는 더욱 단축될 터였다.
실제로 여고동창생들로 구성된 두 팀과도 전혀 모르는 사이가 아니었다. 49년생 S여고 그룹은 미국에 사는 형수와 같은 연령대라서, 또 57년생 M여고 그룹은 잘 아는 직장선배의 부인이 그 학교 출신이기에 한두 사람만 통하면 서로를 알 수 있는 사이여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It's a small world!"라고 감탄하거나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다.


4월 하순 프랑스를 여행하면서 크게 인상적인 것은 평야가 전 국토면적의 70%나 되는 농업국가이고 곳곳에 유채꽃이 만발해 있었다는 점이다. 비행기가 파리에 접근하면서 고도를 낮추자 다각형의 노란 꽃밭이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 밀원(蜜源)식물인 유채는 식용으로도 쓰이지만 꽃이 핀 후 씨앗에서 짜낸 기름이 식용(카놀라유)과 공업용 바이오 기름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몽생미셸로 가는 도로 연변에 양들이 평화롭게 풀을 뜯는 가운데 나무에 새둥지 같은 게 눈에 많이 띄었다. 새둥지 치고는 너무 많다 싶어 가까이 가서 보니 나무에 기생하는 식물이었다. 서구에서는 사철 푸른 겨우살이 기생식물이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많이 쓰이므로 유독 프랑스의 나무 숲에 많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종종 마음이 불편한 장면도 있었다.
예컨대 파리의 라데팡스와 여러 도시에서 프랑스에서 세 번째로 큰 Societe Generale 은행의 간판을 보았다. 그 때마다 SG 증권자회사의 한국 지점을 통해 이뤄진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미국에서는 TRS: total return swaps라고 함) 주가조작 의혹이 연상되었다. 그로 인한 주가폭락 소식을 인터넷 뉴스 속보를 통해 알게 되었는데, 그에 의하면 돈 많은 의사와 가수가 여럿 관련되었다고 전했다. 그와 관련된 주식에 투자한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속이 타들고 당혹스러울까 남의 일이라 해도 걱정이 되었다.
Note
1] 장거리 버스 여행을 하는 경우 일행 중에 여행의 주제와 관련된 전문가 또는 덕후급 참가자가 있다면?
무조건 금할 게 아니라 그에게 마이크를 빌려주어도 좋다고 생각한다. 유홍준 교수의 말처럼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이다. 그가 한 번 이상 마이크를 잡을 수 있을지 여부는 다른 참가자들의 피드백과 인솔자의 판단에 달려 있다. 그러므로 마이크 공해(?)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우리나라에도 처음부터 전문가가 동행하며 해설을 해준다며 고품격 교양이라는 이름으로 모객을 하는 여행사가 있다. 또 우리보다 해외여행의 연조가 깊은 일본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하는 테마 관광이 인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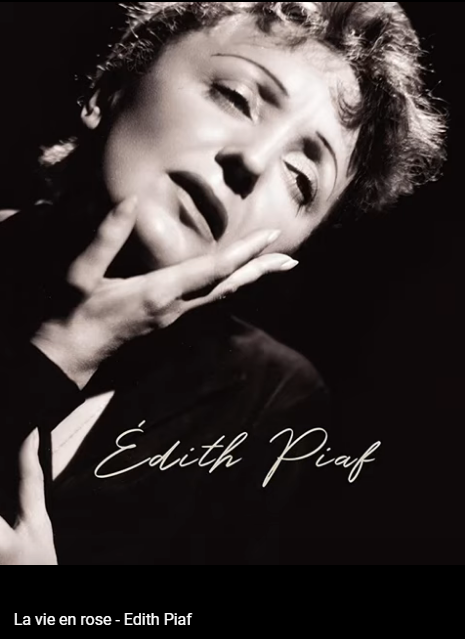
2]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New Bing에 "특정 인물과 몇 단계를 거치면 알 수 있는 사이인지 조사하여 책을 낸 학자와 그의 저서, 간단한 내용을 알려달라" 물어보았다.
질의 내용: Who did the research to see if we can be connected with a particular person by means of several steps of social networking? Let me know the name of the book and its brief synopsis.
New Bing의 답변
(여섯 단계만 거치면 서로 아는 사이가 된다는) 육촌관계라는 개념은 사회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이 1960년대 수행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 밀그램은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단 몇 명의 중개자에 의해 연결되어 있다는 Small World 문제를 조사했다. 밀그램은 보스턴과 오마하에서 3백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보스턴에 있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는 실험을 진행했다. 그들은 자신보다 표적과 더 가깝다고 생각되는 친한 친구에게만 편지를 보낼 수 있었다. 밀그램이 표적에게 도착한 편지를 살펴본 결과, 대체로 여섯 사람을 거쳐 당도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발견 이후 모든 사람은 약 6개의 사슬로 연결되어 있다는 네트워크 개념이 굳어졌다. 이를 토대로 덩컨 와츠는 《Small World: 여섯 다리만 건너면 누구와도 연결된다》(육촌관계: 연결 시대의 과학)이라는 책을 출간했다.
*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3.5명만 거치면 서로 아는 사이가 된다는 Smaller World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문] The notion of six degrees of separation grew out of work conducted by the social psychologist Stanley Milgram in the 1960s. Milgram decided to investigate the so-called small-world problem, the hypothesis that everyone on the planet is connected by just a few intermediaries 1. In his experiments, a few hundred people from Boston and Omaha tried to get a letter to a target—a complete stranger in Boston. But they could only send the letter to a personal friend whom they thought was somehow closer to the target than they were. When Milgram looked at the letters that reached the target, he found that they had changed hands only about six times. This finding has since been enshrined in the notion that everyone can be connected by a chain of acquaintances roughly six links long 1.
One book that explores this topic is “Six Degrees: The Science of a Connected Age” by Duncan Watts. In this book, Watts explores the cutting edge of network science and its practical implications 1.
1. hbr.org 2. arxiv.org 3. arxiv.org
⇒ 대망의 프랑스 일주 여행을 떠나면서
'Travel' 카테고리의 다른 글
| [Book's Day] 스테디 셀러 《총, 균, 쇠》 (0) | 2023.06.13 |
|---|---|
| [AI] 플라타너스에서 비롯된 시간 여행 (0) | 2023.06.03 |
| [프랑스 10] 프랑스 일주 여행을 마치고 (0) | 2023.05.02 |
| [프랑스 9] 지베르니의 모네 정원, 파리 (0) | 2023.05.02 |
| [프랑스 8] 니스와 코트다쥐르 (0) | 2023.05.02 |